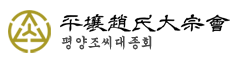6世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선(義旋)과 목은(牧隱) 이색(李穡) 시(詩) 2
법호: 순암(順菴) 당호: 허정당(虛淨堂)이며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오대선사(玄悟大禪師), 자은군(慈恩君),
의선공(義璇公), 삼장공(三藏公), 조순암(趙順菴), 조의선(趙義旋), 삼장순암법사(三藏順奄法師), 선공(璇公)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칭송되었다.
삼장법사(三藏法師)는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에 통달한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로
경장은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 율장은 불교 제자들의 법칙과 규율을 기록한 불경,
논장은 부처의 말씀을 적은 경장의 해설서로, 의선은 삼장에 통달하여 삼장법사 호칭으로 불리웠다.
한국불교사상에서는 의선이 유일하다.
정숙공(貞肅公)의 4남으로 15세에 출가하여 천태종의 고승이 되었다.
중국에서 불도와 유자 사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고려에서도 많은 불교 제자와 유자들을 문도로 두었다.
목은시고 제11권 / 시(詩)
원천태(圓天台)가 화답해 왔으므로, 다시 1수를 지어 그쪽 사자(使者)에게 주어서 받들어 올리다.
소년 시절 서로 이끌고 술을 마실 적엔 / 少年携手酒澆腸
삼월이라 버들꽃이 율양현 같았었는데 / 三月楊花似溧陽
늙어 가매 병이 깊고 폐질환이 많은지라 / 老去病深多肺氣
서책과 함께 서상에만 엎뎌 있을 뿐이네 / 祗從書冊共堆牀
1) 삼월이라…같았었는데 : 이백(李白)의 〈맹호행(猛虎行)〉에, “율양현의 술집에 삼월의 봄이 왔는지라,
아득한 버들꽃이 사람을 시름케 하네.[溧陽酒樓三月春 楊花茫茫愁殺人]” 한 데서 온 말이다.
주석 : 원천태(圓天台)는 요원 스님이며 평양조문 이라는 논문이 있다.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이다.
목은시고 제11권 / 시(詩)
천태판사(天台判事)가 술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조계(曹溪)의 예공(猊公)이 또 마침 왔다. 2수(二首)
국화꽃은 유항에서 피고요 / 菊花開柳巷
죽엽청은 천태에서 나오니 / 竹葉出天台
은은한 술향기는 처음 풍기고 / 泛泛香初散
한들한들 국화는 반쯤 피었네 / 依依蘂半開
병든 몸은 적막함을 감수할 뿐 / 抱痾甘寂寞
높은 산은 오를 생각 없었는데 / 絶意上崔嵬
다시 조계의 늙은이를 만나니 / 更得曹溪老
높이 읊어라 흥을 주체 못하겠네 / 高吟興莫裁
백발의 늙은 몸에 병도 많은데 / 白髮身多病
국화주를 재차 따라 마시노라니 / 黃花酒再斟
노쇠함 붙드는 효력도 있거니와 / 扶衰如有效
흥을 풀매 절로 시가 이루어지네 / 遣興自成吟
찬 이슬은 깊은 계곡에 떨어지고 / 寒露滴幽澗
저녁볕은 먼 숲에 환히 밝아라 / 斜陽明遠林
아득히 먼 천년 위의 / 悠悠千載上
도연명이 바로 나의 지기로세 / 彭澤是知音
주석 : 천태판사(天台判事)는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이다.
나암원공(懶菴元公) 복리군(福利君) 나잔자(懶殘子)라고도 한다.
목은시고 제13권 / 시(詩)
화엄종(華嚴宗)의 대선(大選) 경여(敬如)가 묘각사(妙覺寺)에 있으면서 동파(東坡)의 시(詩)를 가지고
천태(天台)의 원공(圓公)에게 가서 가르침을 듣고, 나를 찾아온 김에 또 이렇게 물으므로,
그가 사문(斯文)을 사모할 줄 아는 것을 기쁘게 여겨 시를 지어 주다.
화엄 골짝의 운림은 멀기만 한데 / 華谷雲林遠
천태와는 도로가 서로 통하였네 / 天台道路通
동파의 시는 장교를 많이 설했고 / 坡詩多藏敎
소사에는 유자의 풍도가 절반일세 / 蕭寺半儒風
익히 읽노라니 등불똥이 떨어지고 / 熟讀燈花落
높이 읊으니 기왓장 눈이 녹누나 / 高吟瓦雪融
사문들을 이미 두루 찾아 만나고 / 斯文尋已遍
다시 이 백발 늙은이를 찾아왔네 / 更訪白頭翁
1) 장교(藏敎) : 불교의 경(經)ㆍ율(律)ㆍ논(論)ㆍ삼장(三藏)의 교리(敎理)를 통틀어 이른 말이다.
2) 소사(蕭寺) : 양 무제(梁武帝)가 절을 짓고 소자운(蕭子雲)을 시켜 비백체(飛白體)로 소(蕭) 자를 크게 써
붙이게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불사(佛寺)를 가리킨다.
주석 : 원천태(圓天台)는 요원 스님이며 평양조문 이라는 논문이 있다.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이다.
목은시고 제15권 / 시(詩)
염동정(廉東亭)이 오자, 유항(柳巷)이 또 술과 안주를 베풀었다.
내 집은 적적하여 이끼만 밟을 뿐이라 / 雀羅門巷踏蒼苔
하도 가난해 묵은 술도 내올 수 없는데 / 貧甚無從覓舊醅
다행히도 서쪽 이웃에 한 상국이 있어 / 賴有西隣韓相國
매양 술과 안주로 오는 손을 접대하네 / 每携牛酒待賓來
1) 하도…없는데 : 두보(杜甫)의 〈만흥(漫興)〉 시에 “시장이 멀어 음식은 여러 가지가 없고,
집이 가난해 술은 다만 묵은 술뿐이네.[盤餐市遠無兼味 樽酒家貧只舊醅]” 한 데서 온 말이다.
주석 : 염동정은 파주염씨 염흥방(廉興邦, ?~1388년)으로 호가 동정(東亭)이다. 정숙공의 외손자
염제신의 차남이다. 목은 이색과 동정 염흥방은 깊은 교류가 있었다. 8世 조준의 좌주이다.
유항(柳巷)은 6세 조위의 묘지명을 쓴 청주한씨 한수(韓脩)로 호가 유항이다.
한수는 7世 조굉(趙宏)의 이종사촌 한악(韓渥)의 손자이다.
목은시고 제16권 / 시(詩)
조사겸(趙思謙)에 대한 만사(挽詞)
정숙의 여러 손자 중 몇이나 남았는고 / 貞肅諸孫幾箇存
당시의 빛난 풍채는 중원까지 비치었네 / 當時風彩照中原
백발로 또 성남 길에 만가를 부르노라니 / 白頭又挽城南路
쓸쓸한 새벽빛에 두 눈이 깜깜하구나 / 曉色蒼涼兩眼昏
정숙(貞肅) : 정숙은 조인규(趙仁規) 시호이다.
주석 : 8世 조사겸은 7世 평양군(平壤君) 조충신(趙忠臣)의 아드님으로
종부령공파, 절도공파, 상호군공파 파조분들의 조부님이시다.
목은시고 제16권 / 시(詩)
희안(希顔)이 자기 선군(先君)의 묘명(墓銘)을 베껴 가므로, 나는 노쇠하여 아직까지 한산(韓山)의 선영(先塋)에
묘명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를 스스로 탄식하면서 인하여 세 수를 짓다.
희안의 형제가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 希顔兄弟奉慈堂
가풍을 잘 지키어 모두 입신 양명하고 / 不墜家風總立揚
선군 사적 기술하여 후세에 전하는데 / 名述先君傳後世
늙은 목은 문장 모자람이 가련하구나 / 自憐老牧少文章
남의 묘지명 써준 것 또한 이미 많아서 / 把筆銘人亦已多
때때로 마음 감동해 눈물 줄줄 흘리네 / 時時動念涕滂沲
적막한 한산 선영엔 송추만 늙어가니 / 韓山寂寞松楸老
어느 때나 빗돌이 푸른 등라를 비출꼬 / 何日龜趺照碧蘿
조모께서 팔십삼 세로 생애를 마쳤는데 / 祖母年終八十三
무덤엔 지명 있어 교목에 덮이어 있네 / 幽堂有石蔭楩楠
익재의 노련한 글이 엄정하고 간결하니 / 益齋老筆嚴仍簡
후일에 아름다운 얘기로 흘러 전하리 / 他日流傳作美談
1) 희안(希顔) : 고려 말기의 권렴(權廉)의 아들로 벼슬이 전공 판서(典工判書), 지신사(知申事), 밀직 제학(密直提學)에
이른 권주(權鑄)의 자이다. 저자가 일찍이 그의 부친인 현복군(玄福君) 권렴의 묘지명(墓誌銘)을 지었다.
2) 조모(祖母)께서…전하리 : 조모는 곧 저자의 조모인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이씨(李氏)를 가리킨다. 그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40년을 수절하면서 이배(李培), 이곡(李穀) 두 아들을 기르고 가르쳤던바, 마침내 곡이 원조(元朝)의
제과(制科)에 합격하고 벼슬이 재상 지위에 오름으로써 그에게 삼한국대부인이 봉해졌고, 83세로 생애를 마쳤는데,
이런 사실이 모두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이 쓴 그의 묘지명(墓誌銘)에 나타나 있으므로 한 말이다.
주석 : 희안(希顔) 권주는 6世 조련의 외손자이다. 이 시에서 "희안의 형제가 어머니를 모시면서"의 어머니는
조련의 장녀이다. 5남 6녀를 낳았다. 조련의 장녀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여러 자손들을 가르침에 법도가
있었으니 종족들이 칭송하였다. 희안 권주의 배위는 첨의평리(僉議評理) 정빈(鄭頻)의 딸이다.
9世 문평공(文平公) 조박과 함께 관직 생활을 했다.
한국고전번역원 | 임정기 (역) | 2001
주석 : 이색(李穡, 1328~1396) 호는 목은(牧隱), 자는 영숙(潁叔).
가정 이곡의 아들이며. 익재 이제현의 제자이다.
8世 조호의 스승이며, 조선의 모든 유학자들의 스승이다.
출처 : 평양조씨대동보, 이색 목은집, 한국고전번역원, 고려사, 한민족대백과사전.
작성 : 26세손 첨추공파 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