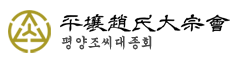6世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선(義旋)과 목은(牧隱) 이색(李穡) 시(詩) 1
법호: 순암(順菴) 당호: 허정당(虛淨堂)이며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오대선사(玄悟大禪師), 자은군(慈恩君),
의선공(義璇公), 삼장공(三藏公), 조순암(趙順菴), 조의선(趙義旋), 삼장순암법사(三藏順奄法師), 선공(璇公)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칭송되었다.
삼장법사(三藏法師)는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에 통달한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로
경장은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 율장은 불교 제자들의 법칙과 규율을 기록한 불경,
논장은 부처의 말씀을 적은 경장의 해설서로, 의선은 삼장에 통달하여 삼장법사 호칭으로 불리웠다.
한국불교사상에서는 의선이 유일하다.
정숙공(貞肅公)의 4남으로 15세에 출가하여 천태종의 고승이 되었다.
중국에서 불도와 유자 사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고려에서도 많은 불교 제자와 유자들을 문도로 두었다.
목은시고 제3권 / 시(詩)
이해 봄에 밀직 재상(密直宰相) 윤지표(尹之彪)가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나를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아서 함께 경도(京都)로 가는 길에 금교(金郊)의 도중에서 읊다.
푸르른 송악산에 자주 머리 돌리어라 / 鵠峯蒼翠屢回頭
노나라 떠나기 더딤이 또 한 가을일세 / 去魯遲遲又一秋
금의환향을 얻은들 장차 어디에 쓸거나 / 縱得錦還將底用
흰 구름 깊은 곳에 기탁하여 은거하련다 / 白雲深處寄菟裘
1) 노(魯)나라 떠나기 더딤 :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공자(孔子)가 제(齊)나라를 떠날 적에는 밥을 짓기도 전에
담근 쌀을 건져서 급히 떠났고, 노나라를 떠날 적에는 이르기를, ‘더디어라 나의 행차여.’ 하였으니, 그것은
부모(父母)의 나라를 떠나는 도리이다.” 한 데서 온 말로, 고국을 떠나게 됨을 비유한 것이다. 《孟子 萬章下》
주석 : 6世 조연수의 둘째 사위 윤지표(尹之彪)가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이색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아서 함께
원에 사신으로 갔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세월이 흘러 후손끼리 혼인을 하게 된다.
8世 조호는 이색의 문생이다.
목은시고 제5권 / 시(詩)
남양(南陽) 홍규(洪奎)가 묘련사(妙蓮寺)의 무외국사(無畏國師)가 젓대를 잘 분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젓대를 들고 방장(方丈)에 들어가 청하니, 국사가 그를 위해 두어 곡조를 불었다.
국사를 누가 적가의 스승이라 일렀던가 / 國師誰道笛家師
아침에 손을 만나서 처음 한 번 불었네 / 見客朝來始一吹
사미에게 알리노니 괴이케 여기지 말라 / 爲報沙彌莫驚怪
오묘한 도리는 그것과 무관한 것이란다 / 此中消息不關伊
1) 사미(沙彌) : 불문(佛門)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득도식(得度式)을 막 끝낸, 수행이 아직 미숙한 중을 가리킨다.
주석 : 익재 이제현 시에 이색이 지은 시와 같은 시가 있는데 동시대를 함께 지내지는 않았지만,
의선-이제현-이곡-이색-조호등 세대를 이어가며 친교가 이어졌다
남양홍씨 홍규는 7世 조일신의 이모부 홍융의 부친이다.
무외국사(無畏國師)정오(丁午)는 5世 혼기대선사이다.
익재 이제현의 시에도 이색과 같은 주제로 무외국사를 표현한 시가 있다.
http://www.pycho.org/index.php?mid=free_board&document_srl=2480947
목은시고 제7권 / 시(詩)
묘련사(妙蓮寺)의 조순암(趙順菴) 법사(法師)가 발견한 석지조(石池竈)에 대하여,
익재(益齋) 선생이 쓴 기문(記文)의 후미에 제(題)하다.
텅 비고 맑은 당 중의 늙은 스님은 / 虛淨堂中老
마음이 맑아 물건 절로 드러났네 / 心淸物自形
아이 적엔 묘련사에서 노닐었고 / 兒戲妙蓮社
나그네로는 한송정에 들렀었네 / 客過寒松亭
언뜻 보니 신이 내린 것 같았고 / 乍見若神授
오래 비장됨은 지령에 응함일러라 / 久藏應地靈
가운데는 맑디맑은 물을 담고 / 心涵水淡淡
주둥이론 찬바람을 끌어들이네 / 口引風冷冷
젓대는 가정으로부터 얻어졌고 / 笛向柯亭遇
보검은 풍옥으로부터 나타났도다 / 劍從豐獄呈
고금의 이치가 똑같은 법칙이라 / 古今同一轍
천재에 맑은 향기를 풍기리로다 / 千載揖淸馨
주석 : 석지조는 석지조기라는 이제현의 글이 있다. 허정당(虛淨堂)은 순암(順菴)이 거처하던 곳의
당호(堂號)인데, 《가정집》 권4에 가정 이곡이 그를 위해 지어 준 기문(記文)이 있다.
목은시고 제9권 / 시(詩)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과 곡성(曲城) 시중(侍中)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부름을 받고 한자리에 참여하였다. 인하여 좋은 일을 기록하다.
두 노인은 수시로 들러주는데 / 二老過從數
나는 병석에서 이제 겨우 일어났네 / 孤生病起初
모시길 용납해 줌은 다행이거니와 / 幸容陪杖屨
서로 이웃이 된 게 또한 기쁘네 / 更喜接門閭
두부 반찬에 토란을 곁들이었고 / 豆腐蹲鴟雜
좋은 쌀은 개구리 울던 나머지로다 / 香粳吠蛤餘
말린 양고기에 좋은 술 따를 제 / 乾羊斟美酒
가을 경치는 뜨락에 가득하구나 / 秋色滿庭除
1) 좋은…나머지로다 : 소식(蘇軾)의 시에, “서늘한 벼논엔 막 개구리가 운다.[稻涼初吠蛤]” 한 데서 온 말이다
주석 : 길창부원군은 안동권씨 권준(權準)으로 6世 조련의 첫째 사위 권렴(權廉)의 부친이다.
권준의 따님과 남양홍씨 홍탁이 혼인하여 낳은 딸이 7世 조일신의 배위이다.
곡성(曲城)시중(侍中)은 파주염씨 곡성부원군 염제신(廉悌臣)으로 정숙공의 외손자이다.
목은시고 제11권 / 시(詩)
원천태(圓天台)가 화답해 왔으므로, 시자(侍者)를 마주하여 절구(絶句) 2수를 읊조리다.
웃는 얼굴에 근심이 있는 줄을 누가 알랴 / 誰知笑臉有愁腸
복사꽃 오얏꽃 봄 경치 상양궁에 가득하네 / 桃李春光滿上陽
맑고 속되지 않은 연꽃을 유독 사랑하노니 / 獨愛蓮花淸不俗
솔솔 향기로운 바람이 승상에 들어오누나 / 香風細細入繩牀
수레 소리 덜컹덜컹 양장판을 둘러 오르니 / 車聲轆轆遶羊腸
성도를 향하여 자양을 방문한 듯하여라 / 似向成都訪子陽
늙은 목은은 병중에 문 닫고 깊이 앉아서 / 老牧病來深閉戶
홀로 가을달이 금상을 비추게 하노라 / 獨敎秋月照琴牀
1) 원천태(圓天台) : 고려 말기의 선승(禪僧)이었던 천태도대선사(天台都大禪師) 요원(了圓)을 가리킨다.
2) 상양궁(上陽宮) : 당나라 고종(高宗)이 세운 궁전(宮殿) 이름인데, 현종(玄宗) 때에 와서는 양 귀비(楊貴妃)가
현종의 총애를 독점하면서 궁녀(宮女) 중에 미인(美人)들을 모두 이 상양궁으로 옮겨 방치(放置)해 버렸다고 한다.
3) 승상(繩牀) : 새끼줄로 꼬아 짜서 만든 교의(交椅)를 말한다.
4) 성도(成都)를…듯하여라 : 자양(子陽)은 후한(後漢) 공손술(公孫述)의 자이다. 왕망(王莽) 때에 공손술이 서촉(西蜀)
에서 칭제(稱帝)하여 성도에 도읍을 했는데, 성도는 사방에 험준한 산들이 둘러 있었으므로 한 말이다.
5) 금상(琴牀) : 거문고를 안치해 놓은 상을 가리킨다.
주석 : 요원 스님은 평양조문 이라는 논문이 있다. 6世 삼장법사의 제자이다.
목은시고 제11권 / 시(詩)
가을날에 나잔자(懶殘子)를 삼가 생각하면서 인하여 시 5수를 읊어서 주실(籌室)에 받들어 올리다.
천태를 회상하니 애가 끊어지려 하여라 / 回首天台欲斷腸
석교의 사람 그림자는 석양에 걸렸으리 / 石橋人影掛夕陽
지금 나는 도리어 한산사처럼 느껴져서 / 如今却似寒山寺
한밤중에 종소리가 병상에 이르는구려 / 半夜鐘聲到病牀
하도 빠른 세월에 절로 애가 끊어져라 / 流光飄忽自摧腸
창으로 해 붙잡던 노양공이 생각나네 / 駐日戈頭憶魯陽
수미산의 대천세계를 훌훌 떨쳐 버리고 / 手擲須彌大千界
두 다리 가부좌하여 선상에 앉았네그려 / 却盤雙脚坐禪牀
젊은 날엔 뛰어난 문장 다투어 펼치면서 / 少日爭披錦繡腸
이따금 고양의 주도를 사모했으니 / 酒徒往往慕高陽
미친 늙은이인 나를 응당 미워하련만 / 老狂有客應嗔我
나는 아직도 와상에 누워 시만 읊노라 / 口尙吟詩偃在牀
옛 친구 적적하여 시름겹기 그지없어라 / 舊游寂寂九回腸
제비는 오의항 떠나고 석양만 비꼈는데 / 燕去烏衣但夕陽
귀뚜라미는 쓸쓸한 시인을 불쌍히 여겨 / 蟋蟀却憐騷客冷
깊은 밤 풍로 속에 내 침상으로 들어오네 / 夜深風露入空牀
고금의 일에 상심되어 속에 번열이 나서 / 感古傷今熱肺腸
처마 밑에 홀로 앉아 아침 해를 쪼이네 / 茅簷獨坐負朝陽
원룡에겐 백 척의 높은 누각이 있거니 / 元龍百尺高樓在
1) 나잔자(懶殘子) : 고려 말기의 선승(禪僧)인데, 천태판사(天台判事)가 되었고, 복리군(福利君)에 봉해졌다.
이색과는 젊어서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2) 주실(籌室) : 인도(印度)의 우바국다 존자(憂波鞠多尊者)가 많은 사람들을 교화 제도하였는데, 그가 한 사람을
제도할 적마다 산가지[籌] 하나씩을 둔 것이 높이와 넓이가 모두 육장(六丈) 되는 방에 가득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수행인(修行人)을 교화 지도하는 방장 화상(方丈和尙)을 가리킨다.
3) 천태(天台)를…걸렸으리 : 천태는 곧 지자대사(智者大師) 지의(智顗)가 처음 천태산(天台山)에 들어가 교화를
크게 행하여 마침내 천태종(天台宗)의 개조(開祖)가 됨으로 인해서 범칭 불교(佛敎)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요,
석교(石橋)는 천태산에 있는 돌다리인데, 이것이 두 산을 연결하여 그 모양이 마치 교량(橋梁)처럼 생겼으므로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4) 지금…이르는구려 : 한산사(寒山寺)의 일명은 풍교사(楓橋寺)인데, 당(唐)나라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
시에, “고소성 밖의 한산사에서, 한밤중 종소리가 나그네 배에 이르누나.[姑蘇城外寒山寺 夜半鐘聲到客船]”
한 데서 온 말이다.
5) 창으로…노양공(魯陽公) : 전국 시대 초(楚)나라 노양공이 한(韓)나라와 한창 싸우던 중에 마침 해가 곧
넘어가려 하자, 노양공이 창을 잡고 해를 향하여 휘두르니, 해가 마침내 삼사(三舍)의 거리를 되돌아왔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6) 고양(高陽)의 주도(酒徒) : 초한(楚漢) 시대 역생(酈生)이 패공(沛公)을 알현하려고 할 때 패공의 사자(使者)가
역생을 거절하며 말하기를, “패공께서 삼가 선생(先生)을 거절합니다. 한창 천하(天下)를 일삼는 터라,
유자(儒者)를 만나 볼 겨를이 없습니다.”고 하자, 역생이 눈을 부릅뜨고 사자를 질책하여 말하기를,
“나는 고양의 주도일 뿐, 유자가 아니다.”고 한 데서 온 말로, 술이나 즐겨 마시고 방탕하여
법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7) 제비는…비꼈는데 : 오의항(烏衣巷)은 지명으로, 동진(東晉) 때에 특히 왕씨(王氏)ㆍ사씨(謝氏) 등 망족(望族)이
이곳에 살면서 명성을 크게 드날렸다. 당(唐)나라 유우석(劉禹錫)의 〈오의항〉 시에, “주작교 가에는 들풀이
꽃을 피우고, 오의항 어귀에는 석양이 비꼈는데, 그 옛날 왕씨 사씨 집의 제비들이, 보통 백성들 집으로
날아드누나.[朱雀橋邊野草花 烏衣巷口夕陽斜 舊時王謝堂前燕 飛入尋常百姓家]” 한 데서 온 말로,
세월의 변천 속에 인생의 무상함을 의미한 말이다.
8) 원룡(元龍)에겐…논할쏜가 : 원룡은 삼국 시대 위(魏)나라 진등(陳登)의 자이다. 허사(許汜)가 일찍이 진등을
찾아갔을 때 진등이 허사를 손님으로 정중히 대접하지 않아서 자기는 높은 와상으로 올라가 눕고, 손님인
허사는 아래 와상에 눕게 했는데, 허사가 이 사실을 유비(劉備)에게 말하자, 유비가 말하기를, “그대는
국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 채택할 말이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원룡이 꺼리는
바인데, 어찌 그대와 얘기를 나눌 까닭이 있겠는가. 소인(小人) 같았으면 자신은 백척루(百尺樓) 위에 올라가
눕고, 그대는 맨땅에 눕게 했을 터이니, 어찌 위아래의 와상 차이만 두었겠는가.”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주석 : 천태판사(天台判事)는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이다.
나암원공(懶菴元公) 복리군(福利君) 나잔자(懶殘子)라고도 한다.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역)
주석 : 이색(李穡, 1328~1396) 호는 목은(牧隱), 자는 영숙(潁叔).
가정 이곡의 아들이며. 익재 이제현의 제자이다.
8世 조호의 스승이며, 조선의 모든 유학자들의 스승이다.
작성 : 26세손 첨추공파 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