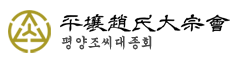6世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선(義旋)과 가정(稼亭) 이곡(李穀) 시(詩) 하편
법호: 순암(順菴) 당호: 허정당(虛淨堂)이며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오대선사(玄悟大禪師), 자은군(慈恩君),
의선공(義璇公), 삼장공(三藏公), 조순암(趙順菴), 조의선(趙義旋), 삼장순암법사(三藏順奄法師), 선공(璇公)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칭송되었다.
삼장법사(三藏法師)는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에 통달한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로
경장은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 율장은 불교 제자들의 법칙과 규율을 기록한 불경,
논장은 부처의 말씀을 적은 경장의 해설서로, 의선은 삼장에 통달하여 삼장법사 호칭으로 불리웠다.
한국불교사상에서는 의선이 유일하다.
정숙공(貞肅公)의 4남으로 15세에 출가하여 천태종의 고승이 되었다.
중국에서 불도와 유자 사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고려에서도 많은 불교 제자와 유자들을 문도로 두었다.
가정집 제16권 / 율시(律詩)
가까이 거하면서 순암(順菴)에게 증정하다.
나의 거처가 청련사와 가까워서 / 居近靑蓮宇
틈만 나면 뻔질나게 드나든다네 / 偸閑步屧頻
바람 소리에 풍경이 대꾸를 하고 / 風聲鈴對語
달밤에는 탑 그림자 몸이 나뉘네 / 月影塔分身
연하와 벗하는 방은 예전과 똑같은데 / 室邇煙霞古
물상이 자라나는 봄 뜰은 늘 새로워라 / 園春物象新
우리 스님은 진속은 싫어하지만 / 知師厭塵俗
오직 시인만은 피하지 않는다오 / 唯不避詩人
1) 진속(塵俗) :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속세
가정집 제16권 / 율시(律詩)
순암(順菴)의 육순음(六旬吟)에 차운하다
밝은 시대에 허명이 요행히 용납을 받아 / 昭代虛名幸見收
반백이 되려는 나이에 돌아가 쉬지도 못하네 / 年將半百未歸休
사책에 주묵(朱墨)을 가한들 끝내 무슨 소용이리 / 硏朱汗竹終安用
백발을 뽑으며 꽃을 보니 문득 스스로 부끄러워 / 鑷白看花却自羞
속인의 눈 놀라게 할 재주도 없음을 알았거니와 / 已分無才驚俗眼
사람의 머리 짓누르는 운명이 있음을 또 알았네 / 更諳有命壓人頭
육순을 읊으신 시 참으로 노래할 만하니 / 六旬盛作眞堪詠
백옥 지비의 경지를 알아볼 수 있겠네 / 伯玉知非庶可求
1) 백옥 지비(伯玉知非) : 춘추 시대 위(衛)나라의 현대부(賢大夫) 거백옥(蘧伯玉)이 나이 육십이 되었을 때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고 고쳤다는 고사를 말한다. 《장자》 〈칙양(則陽)〉에 “거백옥은 나이 육십이 되는
동안 육십 번이나 잘못된 점을 고쳤다. 〔蘧伯玉行年六十而六十化〕”라는 말이 나온다. 《회남자(淮南子)》
〈원도훈(原道訓)〉에는 “나이 오십에 사십구 년 동안의 잘못을 깨달았다.〔年五十而知四十九年非〕”라고 하였다.
가정집 제16권 / 율시(律詩)
연성사(延聖寺)의 옥잠화(玉簪花) 시에 차운하다
돈 주고 사서 심은 그 뜻 얼마나 깊은지 / 靑錢買種意何深
비바람 몰아치면 정을 가누지 못하누나 / 雨打風翻不自任
어찌 국색을 과시하는 화왕에 비기겠소만 / 豈比花王誇國色
천녀를 따라 선심을 시험하는 듯싶소이다 / 似隨天女試禪心
향 사르며 문 닫고서 누구와 함께 감상할까 / 燒香閉閣誰同賞
지팡이 짚고 문 두드려 혼자서라도 찾아야지 / 拄杖敲門擬獨尋
나는 꽃 마주하여 이 노래를 부를 테니 / 我欲對花歌此曲
스님은 줄 없는 거문고나 한번 타시오 / 請師一撫沒絃琴
1) 연성사(延聖寺) : 원의 수도 대도에 있던 절. 삼장법사 의선이 주석했던 사찰 이름.
2) 국색(國色)을 과시하는 화왕(花王) : 모란을 가리킨다. 모란의 비범한 향기와 색깔을 국색천향(國色天香)이라고 한다.
3) 천녀(天女)를……듯싶소이다 : 중인도(中印度) 비사리성(毘舍離城)의 장자(長者) 유마힐(維摩詰)이 여러 보살(菩薩)과
사리불(舍利佛) 등의 대제자(大弟子)들을 대상으로 설법할 적에 천녀가 나타나서 천화(天花)를 뿌렸는데, 이때 일체의
분별상(分別想)을 끊어 버린 보살에게는 이 천화가 달라붙지 않은 반면에, 아직 분별상을 단절하지 못한 대제자 등의
옷에는 이 천화가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유마경(維摩經)》 〈관중생품(觀衆生品)〉에 나온다.
가정집 제17권 / 율시(律詩)
연성사(延聖寺)에서 노닐며
봄바람은 범왕의 집에도 찾아올 줄 아는데 / 春風解到梵王家
객자만 유독 놀랍게도 좋은 시절 등졌네 / 客子偏驚負歲華
담장 모서리에 몇 치 깊이로 쌓인 새벽 눈 / 曉雪墻隈深數寸
간밤 내내 비바람이 배꽃을 지게 하였구먼 / 夜來風雨落梨花
1) 연성사(延聖寺) : 원의 수도 대도에 있던 절. 삼장법사 의선이 주석했던 사찰 이름.
2) 범왕(梵王)의 집 : 부처를 모신 집이라는 뜻으로, 사찰을 말한다.
가정집 제17권 / 율시(律詩)
순암(順菴)의 원숭이를 읊은 시 2수
조물의 뜻이 워낙 기괴하니 / 造物足奇怪
부생의 미래를 알 수나 있나 / 浮生無定期
그중 가장 불쌍한 것은 인면의 짐승 / 最憐人面獸
법신의 스님 곁에 와서 따라다니누나 / 來伴法身師
심심풀이로 재주 부리는 구경도 하고 / 破悶看呈技
손님 초대해 시 지어라 강요도 하고 / 邀賓索賦詩
도토리를 굳이 분배할 필요 있으랴 / 何須强分栗
이 세상도 서로들 속고 속이는데 뭘 / 世俗自相欺
숲 속으로 돌아갈 희망은 없다고 해도 / 林棲無復望
우리에 갇혀 살 줄은 생각도 못했으리 / 檻束本非期
옥환(玉環)을 남긴 곳과는 소식도 끊어진 채 / 信斷留環處
검술을 가르친 스승의 이름만 전하누나 / 名傳學劍師
팔이 길쭉하니 활을 잘 익힐 만도 하고 / 臂長堪習射
어깨가 솟았으니 시를 잘 읊을 듯도 하고 / 肩聳似吟詩
괴이하도다 너처럼 유독 속임수가 많은 놈이 / 怪汝偏多詐
사람을 만나면 도리어 기만을 당하곤 하니 / 逢人却被欺
1) 도토리를……있으랴 :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우언(寓言)을 말한다. 송나라 저공(狙公)이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도토리를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성내더니,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주겠다고 하자
모두 기뻐하더라는 내용이 《장자》 〈제물론(齊物論)〉에 나온다.
2) 옥환(玉環)을 남긴 곳 : 협산사(峽山寺)를 가리킨다. 당나라 손각(孫恪)이라는 자가 원씨(袁氏)의 딸을 부인으로 맞고
나서 10년이 지나 두 아들을 데리고 협산사에 갔다. 원씨가 단장을 하고 노승(老僧)을 찾아가 벽옥환(碧玉環) 하나를
바치면서 ‘이 사원의 옛 물건〔院中舊物〕’이라고 하였는데, 노승이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채지 못하였다.
재(齋)가 끝난 뒤에 야생 원숭이 수십 마리가 슬피 울부짖자, 원씨가 이를 측은하게 여겨 시 한 수를 짓고 나서는 옷을 찢고
늙은 원숭이로 몸을 바꿔 그 원숭이들의 뒤를 따라갔다. 노승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는 말하기를 “이 원숭이는
빈도(貧道)가 사미(沙彌) 시절에 기르던 것이다.……그리고 이 벽옥환은 본래 가릉(訶陵)의 호인(胡人)이 시주한 것인데,
당시에 역시 원숭이 목에 걸어 두었다가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당나라 배형(裴鉶)이 지은
〈손각(孫恪)〉에 나온다. 참고로 소식(蘇軾)의 시에 “가인 원씨(袁氏)는 검술의 명인인 백원옹(白猿翁)의 자손으로서,
유희하며 잠시 인간 세상에 나와 손각(孫恪)의 아내가 되었는데, 홀연히 야생 원숭이들과의 추억을 떠올리고는, 시를 한 수
짓고 옥환을 남겼다네.〔佳人劍翁孫 游戲暫人間 忽憶嘯雲侶 賦詩留玉環〕”라는 구절이 나온다. 《蘇東坡詩集 卷38 峽山寺》
3) 검술(劍術)을 가르친 스승 : 백원(白猿)을 가리킨다. 춘추 시대 월인(越人) 처녀가 월왕(越王)에게 검술을 가르치려고 길을
가던 도중에 ‘흰 원숭이〔白猿〕’가 변신한 원공(袁公)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의 요청을 받고는 검술 시합을 하였는데, 원공이
그녀를 상대하다가 나무 위로 날아올라 다시 흰 원숭이로 몸을 바꿔 사라졌다는 전설이 동한 조엽(趙曄)이 지은 《오월춘추
(吳越春秋)》 권9〈구천음모외전(句踐陰謀外傳)〉에 나온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후대에 검술의 명인을 백원공(白猿公)은
백원옹(白猿翁)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4) 팔이……하고 : 한나라의 명장 이광(李廣)이 원숭이처럼 팔이 길어서 천성적으로 활을 잘 쏘았다는 고사가 전한다.
《史記 卷109 李將軍列傳》 그래서 활의 명인을 지칭할 때 원비(猿臂)라는 말을 흔히 쓴다.
5) 어깨가……하고 : 성당(盛唐)의 시인 맹호연(孟浩然)은 눈발이 휘날리는 파교(㶚橋) 위를 나귀 타고 지나갈 때
가장 멋진 시상(詩想)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소식(蘇軾)의 시에 “그대는 또 못 보았는가 눈 속에 나귀 탄 맹호연을,
시 읊느라 찌푸린 눈썹 산처럼 솟은 두 어깨를.〔又不見雪中騎驢孟浩然 皺眉吟詩肩聳山〕”이라는 명구가 있다.
《蘇東坡詩集 卷12 贈寫眞何充秀才》
가정집 제19권 / 율시(律詩)
순암(順菴)에게 부치다
갈 때마다 느끼나니 갈수록 주는 지인의 숫자 / 重來轉覺舊游稀
옷을 쉽게도 더럽히는 도성 거리 자욱한 먼지 / 九陌塵埃易滿衣
허정당 앞에 서 있는 몇 그루 잣나무가 / 虛淨堂前數株柏
세한의 계절에 주인님 오기를 고대하더이다 / 歲寒忙待主人歸
1) 허정당(虛淨堂) : 순암(順菴)이 거처하던 곳의 당호(堂號)인데,
《가정집》 권4에 가정 이곡이 그를 위해 지어 준 기문(記文)이 있다.
가정집 제19권 / 율시(律詩)
충숙왕(忠肅王)이 철원(鐵原)에서 사냥할 적에 고석정(孤石亭)에 올라 절구 한 수를 남겼는데, 이때 안부(按部) 정공 자후(鄭公子厚)가
객관(客館)에 썼다. 그리고 뒤에 삼장법사(三藏法師) 조순암(趙順菴)도 그 운에 의거해서 응제(應製)하였다. 이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삼가 절구 두 수를 지었다.
엎어진 앞 수레를 누가 제대로 경계할까 / 覆轍誰能後戒前
여기는 바로 태봉의 유적 옛날의 그 산천 / 泰封遺跡舊山川
왕이시여 먼 사냥은 좋은 계책이 못 된다오 / 勸王遠狩非良策
이유는 하나 간신은 하늘을 겁내지 않으니까 / 只爲姦臣不畏天
산을 등진 관사 그 앞에 펼쳐진 그림 병풍 / 背山官舍畫屛前
반걸음 오르면 백리천이 또 내려다보인다오 / 跬步登臨百里川
술자리에서 다시 만난 우리 어진 태수님 / 置酒更逢賢太守
명절날의 멋진 유람 그야말로 가을 하늘 / 勝遊佳節正秋天
1) 엎어진……산천 : 철원(鐵原)에 도읍을 정한 궁예(弓裔)의 태봉국(泰封國)이 망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말이다.
“앞에 가는 수레가 엎어졌는데도 뒤에 가는 수레가 경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뒤에 다시 엎어지는 것이다.
〔前車覆而後車不誡 是以後覆也〕”라는 말이 한(漢)나라 때 한영(韓嬰)이 지은 《한시외전(韓詩外傳)》 권519장에 나온다.
가정집 제17권 / 율시(律詩)
황회산(黃檜山)을 전송하며
득의한 제공들 여기에 한꺼번에 / 得意諸公此一時
황금 술잔에 비치는 이정의 옥비 / 離亭玉轡映金巵
남아의 출처를 어찌 말로 할 수야 / 男兒出處那容說
나그네의 심사를 그냥 시 한 수로 / 客裏乾坤一首詩
1) 황회산(黃檜山) : 황석기(黃石奇 : ?~1364)를 가리킨다. 회산은 창원(昌原)의 옛 이름이다. 황석기의 장남 황상은
7世 조덕유의 셋째 사위이다. 황회산은 7世 조충신, 정숙공의 외손 염제신(廉悌臣)과 함께 장사성(張士誠)
토벌에 참여하였다.
2) 이정(離亭)의 옥비(玉轡) : 이별하는 정자에 모여든 귀인들의 거마(車馬)라는 뜻이다.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역)
주석 : 이곡(李穀, 1298년~1351년)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중보(仲父), 호는 가정(稼亭)이다. 1320년
과거에 급제하고, 1332년 원나라 정동성(征東省) 향시에 수석으로 선발되었으며, 다시
전시(殿試)에 차석으로 급제하였다(성적은 수석인데 고려인이라 차석이됨). 삼장법사 의선이
북경에 있는 황실 사찰 대천원연성사(黑塔寺)에 주석할 때, 이곡은 북경에서 관직생활을
했으며, 정숙공과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의 인연이 혼기대선사-삼장법사 의선,
동암 이진-익제 이제현, 가정 이곡-목은 이색등이 세대를 이어가며 친교가 있었다.
출처 : 평양조씨대동보, 이곡 가정집, 한국고전번역원, 창원황씨족보.
작성 : 26세손 첨추공파 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