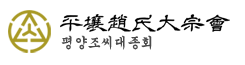6世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선(義旋)과 목은(牧隱) 이색(李穡) 시(詩) 3
법호: 순암(順菴) 당호: 허정당(虛淨堂)이며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오대선사(玄悟大禪師), 자은군(慈恩君), 의선공(義璇公), 삼장공(三藏公),
조순암(趙順菴), 조의선(趙義旋), 삼장순암법사(三藏順奄法師), 선공(璇公)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칭송되었다.
삼장법사(三藏法師)는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에 통달한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로 경장은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 율장은 불교 제자들의
법칙과 규율을 기록한 불경, 논장은 부처의 말씀을 적은 경장의 해설서로,
의선은 삼장에 통달하여 삼장법사 호칭으로 불리웠다.
한국불교사상에서는 의선이 유일하다.
정숙공(貞肅公)의 4남으로 15세에 출가하여 천태종의 고승이 되었다.
중국에서 불도와 유자 사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고려에서도 많은 불교 제자와 유자들을 문도로 두었다.
목은시고 제17권 / 시(詩)
나가고는 싶으나 나가지 못하고 운금루(雲錦樓)를 생각하며 짓다.
방옹의 시어가 맑은 놀이를 상상케 하여라 / 放翁詩語想淸游
말 한 필 두 동복에 시냇길 가을이라 했지 / 一馬二僮溪路秋
늙은 목은은 앓고 나서 다리 힘이 없으니 / 老牧病餘無脚力
가랑비 속에 가마를 타는 것도 풍류라네 / 扶輿細雨亦風流
홀로 여생을 향하여 좋은 회포 펼치면서 / 獨向殘年開好懷
창 앞에 조용히 앉았으면 무어 해로우랴만 / 小窓淸坐有何乖
가마에 실려서 또 꽃구경을 가려고 하네 / 扶輿又欲看花去
텅 빈 운금루엔 물이 계단을 적실 터인데 / 雲錦樓空水浸階
용수산 서쪽 봉우리엔 석양이 걸려 있고 / 龍岫西峰掛夕陽
영릉의 영소는 문왕의 것과 비슷하여라 / 永陵靈沼似文王
세간의 근심과 즐거움은 유수와 같건만 / 世間憂樂如流水
길 위의 행인들은 공연히 애가 끊어지누나 / 路上行人枉斷腸
1) 운금루(雲錦樓) : 고려 충숙왕(忠肅王) 연간에 권렴(權廉)이 개성(開城) 남쪽
용화지(龍化池) 곁에 세운 누각인데, 부근에 연못들이 있어 운금이라 이름한 것이다.
2) 방옹(放翁)의…했지 : 방옹은 송(宋)나라 시인(詩人) 육유(陸游)의 호인데, 그의
유근산(游近山) 시에 “난립한 산 외론 주점에 기럭 소리 석양이요, 말 한 필
두 동복에 시냇길은 가을이로세. [亂山孤店雁聲晚 一馬二僮溪路秋]” 한 데서
온 말이다. 《劍南詩稿 卷41》
3) 영릉(永陵)의…비슷하여라 : 영릉은 고려 충혜왕(忠惠王)의 능호이고, 영소(靈沼)는
곧 문왕(文王)을 사모한 백성들이 문왕의 못을 찬미하여 이름한 것인데, 여기서는
곧 용화지가 궁성(宮城) 안에 있으므로, 이를 문왕의 못에 비유한 것이다.
주석 : 운금루는 6世 조련의 첫째 사위 권렴이 지은 누각이다.
익재 이제현이 지은 운금루기(雲錦樓記)가 있다.
목은시고 제17권 / 시(詩)
판사(判事) 권주(權鑄)가 이중탕(理中湯)을 보내 주었으니,
나에게 설리(泄痢)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기뻐서 짓다.
천지가 푹푹 찌는 건 마치 화롯불 같고 / 乾坤蒸熨是烘爐
기혈이 부실한 건 바로 이 병든 몸인데 / 水土浮虛卽病軀
흥겨워서 읊조릴 마음은 토해 낼 듯하지만 / 遇興吟哦心欲吐
때에 따라 조섭할 계책은 되레 어두웠다네 / 順時調燮策還迂
규헌이 하 좋은 탕제를 갑자기 보내 주니 / 葵軒妙劑俄相惠
유동의 쇠잔한 인생이 부지하게 되었구려 / 柳洞殘生便可扶
공의 나라 다스릴 계책도 넉넉히 알겠으니 / 足見吾公醫國術
몸뚱이를 언제나 탄탄대로에 들여놓을꼬 / 將身何日致亨衢
1) 규헌(葵軒) : 고려 말기의 문신 권주(權鑄)의 호이다.
주석 : 권주는 6世 조련의 외손자이다. 성품이 바르고 성실하였으며 일찍이 등제하여
충주목사·황주목사를 역임하였는데, 백성들을 잘 다스려 칭송을 받았다.
1389년(창왕1) 지신사(知申事)가 되어 과거시험을 관장하였고 이어
밀직제학(密直提學)에 올랐다.
유필로는 여주 신륵사의 신륵사대장각기(神勒寺大藏閣記),
묘향산 안심사(安心寺)의 지공나옹사리석종비(指空懶翁舍利石鐘碑),
고양시 태고사(太古寺)의 원증국사탑비(圓證國師塔碑)가 있다.
목은시고 제18권 / 시(詩)
아이가, 천태판사(天台判事)가 나를 맞이하여 재차 연꽃을
감상하고자 한다고 말하므로, 기뻐서 기록하다.
병든 뒤의 꽃 구경 흥취가 아직 남았는데 / 病後看花興未闌
인간의 세월은 빠르기가 나는 공 같아라 / 人間日月似跳丸
남지의 맑은 물에 연꽃이 반이나 졌다니 / 紅衣半落南池淨
다시 천태의 나잔 스님을 찾아야겠네그려 / 更向天台訪懶殘
주석 : 천태판사는 나암원공(懶菴元公), 나잔자(懶殘子)를 지칭함.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이다
목은시고 제18권 / 시(詩)
한상당(韓上黨)과 내가 장차 천태(天台)의
나잔자(懶殘子)를 방문하려면서 짓다.
우화 선사는 지금 지장사에 머물러 있어 / 芋火禪翁住地藏
연화장세계에 깨끗한 향기가 풍겨나겠네 / 蓮花世界淨生香
한산의 후학은 가난함이 병과도 같은데 / 韓山後學貧如病
유항 선생은 늙을수록 점차 미쳐가누나 / 柳巷先生老漸狂
실솔당 앞에는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요 / 蟋蟀堂前風細細
낙타교 밑에는 물이 아스라이 흐르거니 / 駱駝橋下水茫茫
어찌하면 함께 연못가의 나그네가 되어 / 何當共作池邊客
진종일 흥미진진하게 소리 높여 읊어 볼꼬 / 盡日高吟興味長
1) 우화 선사(芋火禪師) : 당(唐)나라 때 형악사(衡嶽寺)의 고승(高僧) 명찬 선사(明瓚禪師)가
성격이 게을러서 남이 먹고 남은 음식만 먹었으므로 나잔(懶殘)이라 호칭했는데,
이필(李泌)이 일찍이 형악사에서 글을 읽을 때 한번은 밤중에 나잔 선사를 방문했더니,
그때 마침 나잔 선사가 화롯불을 뒤적여서 구운 토란을 꺼내 먹고 있었다는 고사가 있다.
여기서는 고려 말기 천태(天台)의 스님 또한 호가 나잔이었기 때문에 그를 당나라
나잔 선사에 비유하여 이렇게 일컬은 것이다.
2)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 : 불교에서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이 거주한다는
공덕무량(功德無量), 광대장엄(廣大莊嚴)의 세계를 말하는데,
이 세계는 큰 연화(蓮花)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3) 가난함이 병과도 같은데 : 공자(孔子)의 제자 원헌(原憲)이 노(魯)나라에서 몹시 곤궁하게
지낼 적에 자공(子貢)이 아주 화려한 수레를 타고 원헌을 방문하여 말하기를 “아, 선생은
어찌하여 이렇게 병(病)이 들었습니까?” 하자, 원헌이 대답하기를 “나는 듣건대,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 하고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병이라 한다 했으니,
나는 지금 가난한 것이지 병든 것이 아니라오.”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莊子 讓王》
4) 늙을수록 점차 미쳐가누나 : 여기서 미친다는 말은
도(道)에 깊이 진취(進取)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석 : 한상당(韓上黨)은 청주한씨 상당군(上黨君) 한수(韓脩)이다.
6世 조련의 첫째 사위 권렴(權廉)의 남동생 권적(權迪)의 사위이며,
7世 조굉의 외사촌 한악의 손자이다.
천태판사는 나암원공(懶菴元公), 나잔자(懶殘子)이며,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이다
목은시고 제18권 / 시(詩)
나잔자(懶殘子)를 방문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판삼사를 알현하고 / 早興上謁判三司
수레 옮겨 한가히 우화사를 방문하니 / 移駕閑尋芋火師
구슬 같은 빗방울은 대자리에 뿌리고 / 雨似跳珠灑淸簟
일산 같은 연잎은 못물 위에 가득하네 / 荷如傾蓋滿平池
스님은 복지에 몸 두어 세상을 잊었는데 / 致身福地將忘世
나는 위도에서 실각해 시국에 놀란다오 / 失脚危途政駭時
술 사서 도연명 부르는 건 옛날 같은데 / 酤酒引陶猶昔日
소년 시절 왔던 곳에 흰 귀밑털 드리웠네 / 少年行處鬢垂絲
1) 술…건 : 동진(東晉) 때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의 고승(高僧) 혜원 법사(慧遠法師)가
일찍이 도연명(陶淵明)에게 마시도록 허락한다고 하여 도연명이 동림사를 찾아갔던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선승(禪僧)과 유자(儒者)가 서로 어울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석 : 나잔자(懶殘子)는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이다.
나암원공(懶菴元公), 복리군(福利君) 천태판사(天台判事)라고도 한다.
목은시고 제19권 / 시(詩)
어제 천태(天台) 나잔자(懶殘子)를 알현하고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새 붓과 헌 붓 5, 6자루 중에서 내가 좋은 것 2자루를 골라 가져왔으므로,
한 수를 읊어서 기록하여 바치는 바이다.
중산의 모영은 정강하기로 일러왔는데 / 中山毛穎號精強
몸이 천태 지자의 향기에 물이 들었네 / 身染天台智者香
선배들은 모지라져 곧 물러나게 되었고 / 先進摧頹將乞退
후배들은 예리하여 숨어 있길 꺼리누나 / 後來尖利苦嫌藏
끝은 먹물에 젖어 이슬 맞은 듯 촉촉하고 / 鋒磨烏玉滋如露
흔적은 종이에 찍혀라 깨끗하기 서리 같네 / 跡印華牋淨似霜
이미 양생 초치하여 예악을 일으켰기에 / 已致兩生興禮樂
한나라의 면체는 썰렁하여 빛이 없구려 / 漢家綿蕝冷無光
1) 중산(中山)의 모영(毛穎) : 한유(韓愈)의 모영전(毛穎傳)에서 붓을 의인화하여 “모영은
중산 사람이다. [毛穎中山人也]”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붓을 가리킨다.
2) 천태 지자(天台智者) : 천태 지자는 수(隋)나라 때 천태종(天台宗)의 개조(開祖)였던 지자대사
(智者大師)를 가리키는데, 여기 천태(天台) 나잔자(懶殘子) 또한 천태종의 후진(後進)이므로
지자대사에 빗대서 한 말이다.
3) 이미…없구려 : 면체(綿蕝)는 띠풀을 묶어 세운 것을 이른 말로, 한(漢)나라 초기에 숙손통
(叔孫通)이 조정의 의례 (儀禮)를 제정하기 위해 노(魯)나라의 유생(儒生) 30여 인을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야외(野外)에서 띠풀을 묶어 세워 존비(尊卑)의 차례를 표시해 놓고
예(禮)를 강론했던 데서 온 말이다. 양생(兩生)은 숙손통이 앞서 노나라 유생들을 불렀을 때,
숙손통의 행위가 고도(古道)에 합치하지 않는다 하여 부름에 응하지 않았던 두 유생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한(漢)나라 이후로 모든 예악(禮樂)이 붓끝에 의해서
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석 : 나잔자(懶殘子)는 6世 삼장법사 의선의 제자이다.
나암원공(懶菴元公) 복리군(福利君) 천태판사(天台判事)라고도 한다.
한국고전번역원 | 임정기(역) | 2002
주석 : 이색(李穡, 1328~1396) 호는 목은(牧隱), 자는 영숙(潁叔).
가정 이곡의 아들이며. 익재 이제현의 제자이고.
정숙공의 외손자 곡성부원군 염제신의 처조카 사위이다.
8世 조호의 스승이며, 조선의 유학자들의 스승이다.
출처 : 평양조씨대동보, 이색 목은집, 한국고전번역원, 고려사, 한민족대백과사전.
작성 : 26세손 첨추공파 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