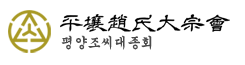6世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선(義旋)과 가정(稼亭) 이곡(李穀) 시(詩) 상편
법호: 순암(順菴) 당호: 허정당(虛淨堂)이며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오대선사(玄悟大禪師), 자은군(慈恩君),
의선공(義璇公), 삼장공(三藏公), 조순암(趙順菴), 조의선(趙義旋), 삼장순암법사(三藏順奄法師), 선공(璇公)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칭송되었다.
삼장법사(三藏法師)는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에 통달한 승려를 높여 부르는 말로
경장은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불경, 율장은 불교 제자들의 법칙과 규율을 기록한 불경,
논장은 부처의 말씀을 적은 경장의 해설서로, 의선은 삼장에 통달하여 삼장법사 호칭으로 불리웠다.
한국불교사상에서는 의선이 유일하다.
정숙공(貞肅公)의 4남으로 15세에 출가하여 천태종의 고승이 되었다.
중국에서 불도와 유자 사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고려에서도 많은 불교 제자와 유자들을 문도로 두었다.
가정집 제7권 / 명찬(銘讚)
순암(順菴)의 진영(眞影)에 대한 찬(讚)
저 한가한 도인이여 / 彼閉道人
배움도 끊어지고 할 일도 없어라 / 絶學無爲
이 크나큰 복전이여 / 此大福田
삼장법사란 일컬음을 받았도다 / 稱三藏師
비단 도포에 빨간색 모자 / 錦袍茜帽
굳이 먹물 옷을 고집하리오 / 安用緇衣
기괴한 일을 행하지도 않거니와 / 不行其怪
시대에 어긋나게 하지도 않았노라 / 不違于時
황왕의 권속으로 / 皇王之眷
불조에 귀의한 분 / 佛祖之依
모습을 보면 이렇다마는 / 視貌則然
그 마음 아는 자는 누가 있을꼬 / 知心者誰
아아 / 嘻
1) 저 ~없어라 : 순암이 스스로 도를 깨우쳐 불교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당나라 선승(禪僧) 영가 현각(永嘉玄覺)이 지은 증도가(證道歌) 첫머리에 “그대는 배움의 길도 끊어진 채
아무 할 일도 없이 그저 한가하기만 한 도인을 보지 못했는가. 그는 굳이 망상을 없애려 하지도 않고
참된 진리를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무명의 참 성품이 바로 불성이 되고 허깨비
같은 빈 몸이 바로 법신이 된다.〔君不見 絶學無爲閑道人 不除妄想不求眞 無明實性卽佛性 幻化空身卽法身〕”
라는 말이 나온다.
가정집 제14권 / 고시(古詩)
순암(順菴)이 새로 대장경(大藏經)을 봉안한 일에 대해 이극례(李克禮) 주판(州判)이 시를 지어
찬미하였기에 내가 그 시에 차운하다
도를 실은 그릇을 모두 경이라고 말하지만 / 載道之器皆謂經
석씨의 교설은 참으로 사량하기 어려운데 / 釋氏所說誠難思
인연과 과보의 설명 하나도 틀리지 않는지라 / 因因果果百不差
부절을 취한 듯 양손으로 수지(受持)한다오 / 如取符契兩手持
대해 용궁에 소장된 반주가 드러나면 / 龍宮海藏露半珠
사녀가 다투어 달려와 가산을 바치나니 / 士女奔競輸家貲
타생의 성불(成佛)의 공덕은 잠시 접어 두고라도 / 他生作佛且休道
오늘날 임금의 장수는 정녕 기약할 수 있으리 / 此日壽君端可期
스님은 본래 의관의 후예로서 / 阿師本是衣冠胄
부귀도 마다한 채 속세를 훌쩍 떠나신 분 / 脫略富貴輕分離
서쪽으로 유력(遊歷)할 제 황제의 은총 듬뿍 받고 / 西遊却被玉皇眷
번쩍이는 비단 장삼에 운하 무늬 가사 걸쳤다오 / 錦袍錯落雲霞披
바랑을 모두 털어 대장경 봉안을 못한다면 / 謂不傾囊置一藏
만겁토록 후회해도 소용없으리라 하였는데 / 噬臍萬劫安能追
여항의 묵본은 세상이 인정하는 보배인지라 / 餘杭墨本世所寶
돛배에 순풍을 보낼 줄 강물 귀신도 알았다네요 / 風帆穩送江神知
평생 손을 좋아하고 재물에 뜻이 없는 분이 / 平生好客不留物
이런 대보를 이뤘으니 더더욱 진귀한 일이로세 / 成此大寶尤瑰奇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 君不見
불문(佛門)에 자취를 의탁하고 부역을 피하면서 / 託迹空門逃賦役
신도의 시주로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자들을 / 還將檀施自利之
1) 대해(大海)……드러나면 : 불경의 간행을 말한다. 불교의 전설에 의하면 대장경(大藏經)이
바다 속 용궁 안에 보관되어 있다가 세상에 드러난다고 한다. 그리고 불법(佛法)이 마치
대해(大海)처럼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장경각(藏經閣)을 해장전(海藏殿)이
라고 부르기도 한다. 반주(半珠)는 나머지 반쪽의 구슬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경전을 가리킨다.
《광홍명집(廣弘明集)》 권 22에 수록되어 있는 당 고종(唐高宗)의 〈술삼장성교서(述三藏聖敎序)〉에
“중화에는 의거할 자료가 없는지라, 인도의 진짜 글을 찾게 되었다. 이에 항하를 멀리 건너 기필코
완전한 문자를 얻으려 하였고, 자주 설산을 등정하여 다시 나머지 반쪽의 구슬을 얻으려고 하였다.
〔以中華之無質 尋印度之眞文 遠涉恒河 終期滿字 頻登雪嶺 更獲半珠〕”라는 말이 나온다.
가정집 제16권 / 율시(律詩)
차운하여 순암(順菴)에게 답하다
반평생 나의 생활 그야말로 이군삭거(離群索居) / 半生光景屬離居
여관 밥이면 충분하지 다른 건 원래 원치 않소 / 旅食從來不願餘
창밖엔 지난밤 비에 흠뻑 젖은 파초 잎이요 / 窓外芭蕉饒夜雨
소반엔 봄에 지천으로 나는 목숙 무침이라 / 盤中苜蓿富春蔬
집안이 가난하니 단표의 즐거움을 절로 누릴 밖에 / 家貧自有簞瓢樂
생계가 졸렬한 것은 필묵이 서툰 때문이 아니라오 / 計拙非因翰墨疎
선탑 가에 화려한 봄꽃의 시절이 찾아왔는데 / 時到煙花禪榻畔
몸과 세상을 좌망한 채 여인숙처럼 보내실지 / 坐忘身世□蘧廬
1) 이군삭거(離群索居) : 《예기》 〈단궁 상(檀弓上)〉에 나오는 말로,
친지나 벗들과 헤어져서 혼자 외로이 사는 생활을 가리킨다.
2) 목숙(苜蓿) : 거여목이라는 소채(蔬菜)의 일종으로, 빈약한 식생활을 비유할 때 흔히 쓰인다.
당나라 설령지(薛令之)가 동궁 시독(東宮侍讀)으로 있을 적에 초라한 밥상을 보고는 슬픈 표정으로
“아침 해가 둥그렇게 떠올라, 선생의 밥상을 비추어 주네. 소반엔 무엇이 담겨 있는고, 난간에서
자라난 목숙 나물이로세.〔朝旭上團團 照見先生盤 盤中何所有 苜蓿長欄干〕” 라는 내용의
〈자도(自悼)〉 시를 지은 고사가 있다. 《唐摭言 卷15》
3) 단표(簞瓢)의 즐거움 :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생활을 가리킨다. 《논어》 〈옹야(雍也)〉의 “어질다,
안회(顔回)여. 한 그릇 밥과 한 표주박 물을 마시며 누항에 사는 것을 사람들은 근심하며 견뎌 내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낙을 바꾸지 않으니, 어질도다, 안회여.
〔賢哉 回也 一簞食 一瓢飮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 回也〕”
라는 공자의 말에서 나온 것이다.
4) 좌망(坐忘) : 《장자》 〈대종사(大宗師)〉에 나오는 말로, 주객(主客)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
합일된 정신의 경지를 뜻하는데, 불가(佛家)의 삼매(三昧)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정집 제16권 / 율시(律詩)
순암(順菴)의 운을 써서 한성재(韓誠齋) 정승의 죽음을 애도하다
도성 문에 붉은 만장 휘날리는 속에 / 都門丹旐想飛飛
천리의 눈물 흔적 오래 마르지 않으리 / 千里啼痕久未晞
모두 세신으로서 고국을 슬퍼하였는데 / 共爲世臣悲故國
홀로 남은 교목 위에 석양이 걸렸어라 / 獨留喬木掛斜暉
임금이 원로를 존중하여 기대들을 하였건만 / 吾王尙老人猶望
나라 일으킬 정승의 일 이미 어긋나 버렸도다 / 彼相扶顚事已違
풍월 어린 연장에서 만나기로 했던 우리 약속 / 風月蓮莊曾有約
공 또한 돌아보며 못 잊어 할 줄 알겠도다 / 知公廻首更依依
주석 : 한성재는 청주한씨 사숙공(思肅公) 한악(韓渥)으로 호가 성재(誠齋)이다.
한어(漢語)와 몽고어에 능하였으며 성품이 신중하고 기량(器量)이 있었다고 한다.
7世 조굉,조천미의 이종 사촌이며, 손자 한수가 6世 조위의 묘지명을 쓰고,
지은이는 이곡이다. 한수의 아들 한상경(韓尙敬)은 개국공신이다.
가정집 제16권 / 율시(律詩)
순암의 동지 팥죽을 고마워하며 아울러 박경헌(朴敬軒)에게도 증정하다
동지에 얼음이 언 것은 일이 잘못되었지만 / 陽復堅氷事已非
새벽 창가에 동지 팥죽은 그대로 어김이 없네 / 曉窓冬粥莫予違
돌차간에 마련한 금곡의 맛이 비록 좋다 하지만 / 咄嗟金谷味雖好
창졸간에 올린 호타의 공도 결코 작지 않았네 / 倉卒滹沱功不微
감우에서 나눠 받아 맛보는 이 향적이여 / 香積共分來紺宇
주비에서 나온 후청을 누가 부러워하랴 / 侯鯖誰羨出朱扉
어떡하면 남산 아래 콩밭의 김을 매고 / 何當鋤豆南山下
이슬에 옷 적시면서 달빛 띠고 돌아올꼬 / 草露霑衣帶月歸
1) 돌차간(咄嗟間)에……맛 : 금곡(金谷)은 진(晉)나라 부호(富豪) 석숭(石崇)의 원명(園名)인데, 석숭이
“손님을 위해 팥죽을 대접하면서 한 번 호흡하는 사이에 마련하게 하였다.〔爲客作豆粥 咄嗟便辦〕”는
기록이 《진서(晉書)》 권33〈석숭열전(石崇列傳)〉에 보인다.
2) 창졸간에……공 :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가 칭제(稱帝)하기 전에 요양(鐃陽) 무루정(無蔞亭)에서
풍이(馮異)에게 팥죽을 대접받아 배고픔을 면하고, 또 남궁(南宮)에 이르러서 보리밥을 대접받은 뒤에
호타하(滹沱河)를 건너갔는데, 제위에 오르고 나서 풍이에게 “창졸간에 무루정에서 대접받은 팥죽과
호타하의 보리밥에 대한 후의를 오래도록 보답하지 못했다. 〔倉卒無蔞亭豆粥 滹沱河麥飯 厚意久不報〕”
라고 하면서 값진 물건을 하사한 고사가 있다. 그래서 후대에 팥죽과 보리밥에 호타(滹沱)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後漢書 卷17 馮異列傳》
3) 감우(紺宇) : 불교 사원의 별칭으로, 감원(紺園) 혹은 감전(紺殿)이라고도 한다.
4) 향적(香積) : 향적여래(香積如來)의 식물(食物)인 향적반(香積飯)의 준말로, 승려의 음식을 가리킨다.
5) 주비(朱扉) : 대문을 붉은색으로 치장한 집으로, 귀족이 사는 고대광실을 가리킨다.
6) 후청(侯鯖) : 오후청(五侯鯖)의 준말이다. 고기와 생선을 합쳐서 만든 요리를 청(鯖)이라고 하는데,
서한 성제(成帝) 때 누호(樓護)가 왕씨(王氏) 가문의 다섯 제후들이 준 진귀한 반찬을 한데 합쳐서
요리를 만들고는 오후청이라고 칭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西京雜記 卷2》
7) 어떡하면……돌아올꼬 : 도잠(陶潛)의 시에 “남산 아래에 콩 심으니, 풀은 무성하고 콩 싹은 드문드문.
새벽에 일어나 잡초를 김매고, 달빛 띠고서 호미를 메고 돌아오네. 좁은 길에 초목이 자라나니, 저녁
이슬이 내 옷을 적시네. 옷 젖는 것이야 아까울 것 있으랴, 그저 농사만 잘됐으면.
〔種豆南山下 草盛豆苗稀 晨興理荒穢 帶月荷鋤歸 道狹草木長 夕露沾我衣 衣沾不足惜 但使願無違〕”
이라는 말이 나온다. 《陶淵明集 卷2 歸田園居》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역)
주석 : 이곡(李穀, 1298년~1351년)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중보(仲父), 호는 가정(稼亭)이다. 1320년
과거에 급제하고, 1332년 원나라 정동성(征東省) 향시에 수석으로 선발되었으며, 다시
전시(殿試)에 차석으로 급제하였다(성적은 수석인데 고려인이라 차석이됨). 삼장법사 의선이
북경에 있는 황실 사찰 대천원연성사(黑塔寺)에 주석할 때, 이곡은 북경에서 관직생활을
했으며, 정숙공과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의 인연이 혼기대선사-삼장법사 의선,
동암 이진-익제 이제현, 가정 이곡-목은 이색등이 세대를 이어가며 친교가 있었다.
출처 : 평양조씨대동보, 이곡 가정집, 한국고전번역원.
작성 : 26세손 첨추공파 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