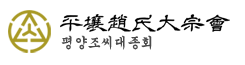6世 삼장법사(三藏法師) 의선(義旋)과 급암(及庵) 민사평(閔思平) 시(詩)
급암시집 제2권 / 율시(律詩)
지정 을미년(1355, 공민왕4) 9월 24일 홍 재상의 평산당을 방문하여 순암의
옛 은혜를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서방정토에 가서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글
한 축을 그에게 주니 내세의 인연을 맺기를 바란다. 〔至正乙未菊月念四日訪
洪相國平山堂念順菴夙昔之恩因贈之以立誓往生西方之文一軸庶結來因〕
젊은 시절에 교분을 맺고 몇 년이 지났던가 / 結髮論交間幾春
평산당 위에서 담소하는 일이 새롭구나 / 平山堂上咲談新
오늘 머리에 가득한 백발에 놀라는데 / 滿頭白髮驚今日
면전에 있는 청산은 친구와 같구나 / 當面靑山似故人
홍 재상은 홀로 - 원문 훼손 - 졸함을 어여삐 여겼고 / 洪相獨憐▨▨拙
순암의 - 원문 훼손 - 술자리에서의 진심을 기억하네 / 順菴▨憶酢中眞
이 마음 이미 - 원문 훼손 - 하여 - 원문 훼손 - 머무르리니 / 此心已▨應▨住
어찌 다시 구구하게 나루터를 물으랴 / 何更區區更問津
한국고전번역원 | 유호진 (역)
주석 : 순암(順菴)은 삼장법사 의선의 법호이고. 홍재상은 7世 조일신의 장인 홍탁(洪鐸)이다.
급암시집 제3권 / 시(詩)
지원 5년(1339, 충숙왕8) 1월 동년 기거주 오 선생과 함께 청계사에서 북두칠성에
절하였다. 읊조려 사운시를 얻었기에 기록하여 오 선생께 바치다
〔至元五年正月奉同同年起注吳先生拜星淸溪寺吟得四韻詩錄呈机下〕
청계사에서 삼일 동안 함께 깨끗이 재계할 때 / 淸溪三日共齋明
경쇠 소리 너머 옥경은 티끌조차 없구나 / 玉境無塵隔磬聲
엄숙하게 기록하여 올리니 사직에게 의지함이요 / 錄奏肅然憑四直
향기로운 제수가 정결하니 삼청에 올림이라 / 馨羞潔爾薦三淸
밤 깊어 가도 조금도 나태하지 않으니 / 夜深亦不生微倦
하늘이 멀어도 오히려 지성으로 감동시킬 수 있으리 / 天遠猶能格至誠
신령한 기운 상서로운 바람으로 큰 은혜 듬뿍 받으리니 / 淑氣祥風多景貺
나라 사람들은 눈을 비비고 태평 시대를 보리라 / 邦人拭目看昇平
한국고전번역원 | 유호진 (역)
주석 : 청계사(淸溪寺)에 방문하여 지은 시
급암시집 제3권 / 시(詩)
차운하여 우곡 선생께 올리다〔次韻拜呈愚谷先生〕
나그네로 떠도는 세월 순식간에 흘렀으니 / 客裏光陰一霎兒
아마 늙은 부모님 생각 많이 하셨으리라 / 可能多費老親思
아름답게 꾸민 창문에 꽃이 무성하니 한가로이 시 읊는 곳이고 / 綺櫳花暗閑吟處
은제 화로에 향기가 사라지니 고요히 앉아 있는 때로다 / 銀葉香銷靜坐時
순암과 함께 오랜 이별의 회포를 말씀하리니 / 應共順菴談契闊
또한 우곡이 헤어짐을 탄식하실 줄 알겠네 / 亦知愚谷嘆睽離
가을바람 부는 고향엔 순채와 농어가 맛 좋으니 / 秋風故國蓴鱸美
상서를 싣고 동쪽으로 가자는 기약을 저버리지 마소서 / 輦瑞東轅莫負期
또〔又〕
내가 도모한 일이 매번 허황됨을 스스로 비웃노니 / 自咲吾謀每謬悠
유 땅을 받는 데 만족하고 은거한 장량만 못하도다 / 不如高臥足封留
추억하노니 일찍이 사천리 밖에서 나그네였던 시절 / 憶曾爲客四千里
말 달릴 때 날씨는 춥고 눈은 갖옷에 가득하였지 / 驅馬天寒雪滿裘
한국고전번역원 | 유호진 (역)
주석 : 우곡(愚谷) 정자후(鄭子厚)
급암시집 제4권 / 시(詩)
순암 삼장을 곡하다〔哭順菴三藏〕
나이가 구십이 다 된 대사 / 年齊九秩大師翁
교종과 선종이 차이가 없네 / 於敎於禪無異同
업에 따라 표류하여 응보가 있음을 가엾게 여기며 / 隨業漂流憐有報
마음을 살피고 예배하고 염불하여 더욱 노력하라 권했지 / 觀心禮念勸加功
일찍이 도연명을 배척하지 않았던 그를 사랑하노니 / 愛他曾不揮陶令
나에게 차공처럼 많이 마시지 말라고 경계하였지 / 誡我毋多酌次公
구슬퍼라 다시는 경책을 듣기 어려우리 / 怊悵更難聞警策
신발 한 짝만 관 속에 부질없이 남았다네 / 空留隻履在棺中
한국고전번역원 | 유호진 (역)
주석 : 신발 한 짝만의 뜻은 달마대사가 죽자 중국 웅이산(熊耳山)에 장사하였는데,
3년 뒤 위(魏)나라의 송운(宋雲)이 서역(西域)에 사자로 갔다 돌아오던 중
총령(葱嶺)에서 달마를 만났다. 달마가 신 한 짝만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송운이
“대사는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대사가 “나는 서역으로 가오.” 하였다.
송운이 이 말을 임금에게 상세히 전하여 임금의 명으로 달마의 묘를 파고
관(棺)을 열어 보니 신이 한 짝만 있었다고 한다. 《傳燈錄》
급암시집(及菴詩集) 제1권 / 고시(古詩)
정몽주에게 보이다〔示鄭夢周〕
내 문하의 정대학 / 吾門鄭大學
이제 훌륭한 아들을 두었네 / 如今有賢嗣
게다가 내 손자와 교유하니 / 況與愚孫游
어찌 자식처럼 보지 않겠나 / 胡不示猶子
한국고전번역원 | 유호진 (역)
주석 : 의선의 문도는 민사평이고, 민사평의 제자가 정운관(정대학鄭大學)인데 포은 정몽주의 부친이다.
민사평(閔思平 1292~1359) : 호는 급암(及庵) 여흥민씨 찬성사 역임. 6世 충숙공 조련의 장인이
안동김씨 김흔으로 첫째 사위가 민사평의 부친 문순공(文順公) 민적(閔頔)이다.
민사평은 7世 조덕유, 조윤선의 이종사촌이다.
출처 : 평양조씨대동보, 고려사, 고려사절요, 급암시집, 한국고전번역원.
작성자 : 26세손 첨추공파 충호.